최종 업데이트 22.02.15 11:56
[시시비비] 'ICT 승자독식 시대'라는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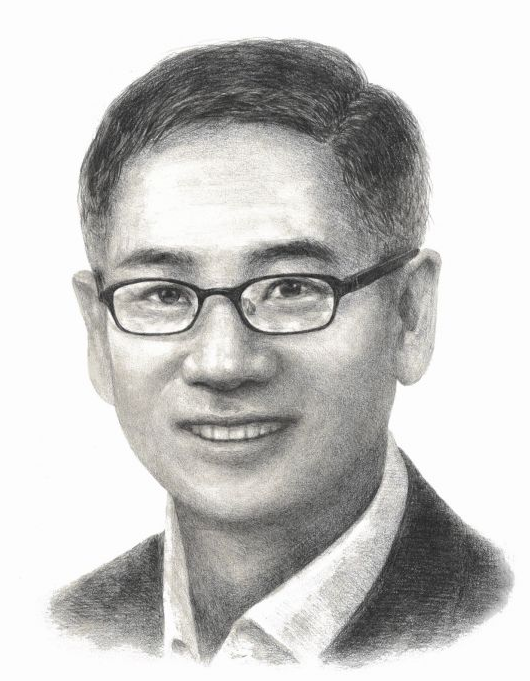
연초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주가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민감한 요인이 있으나 모든 기술주가 그런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과 같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기업들도, 아마존과 같이 회복세를 보이는 기업들도 있다.
기술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 기반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속성이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핵심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게 되고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네트워크에 접속할 디지털기기를 생산하는 제조기업도 비슷하다.
ICT가 연 디지털 시대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시장 규율보다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할수록 더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작년 말 세계 10대 상장기업(미국 8, 중국 1, 대만 1) 가운데 9개사가 기술기업이다. 짧은 시간에 네트워크와 빅데이터가 얼마나 큰 시장가치를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승자독식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기술기업의 동향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5대 기술기업(알파벳·아마존·애플·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MS))은 지난해 2800억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투자의 9%에 이른다. 이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져 더 이상 자신의 영역에 안주할 수 없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있다. 애플이 MS(홀로렌즈), 페이스북(오큘러스)과 겨루기 위해 가상현실 헤드셋을 개발하고, 알파벳, 애플, 아마존이 자율주행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알파벳, 아마존, MS가 경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또다른 예다.
경쟁이 거대 기술기업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페이스북이 틱톡에 고전하고 있듯이 훨씬 규모가 작은 기술기업들과 ICT로 재무장한 오프라인 기업들의 도전도 거세다.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는 2003년 인터넷 게임회사 린든 랩(Linden Lab.)이 개발한 온라인 멀티미디어 플랫폼이다. 세컨드 라이프는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를 열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의 삶을 가상세계에 구현했다. 아직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개되는 정도지만 사람들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미래로 본다.
그러나 생업을 영위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사용자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 세대가 메타버스에 일찍 적응한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현실세계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기술기업들의 부침은 승자독식의 시대는 과장되었으며 시장규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함의를 준다. 혁신과 경쟁이 가능한 것은 엄청난 투자금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글로벌 스타트업이 6210억달러의 벤처자금을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이토록 엄청난 투자금은 저축 과잉에 따라 조성된 낮은 실질금리여서 가능했다.
최근 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실질금리는 이미 500년 전부터 하락해 왔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어쩌면 승자독식의 시대는 아주 먼 미래의 모습인지 모르겠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 LOTTE BIOLOGICS Hosts Technology Development Forum to Foster Future Innovation
- Hanmi Highlights Next-Generation Obesity Pipelines at ObesityWeek 2025
- SK bioscience Earns 'A' Rating in KCGS ESG Assessment for Fourth Consecutive Year
- Huons N to Acquire Health Functional Food Manufacturer 'Biorosette'
- European Commission Grants Approval of Remsima IV Liquid Formulation, World's First Liquid Formulation of IV Infliximab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