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04 10:11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전세계약 남았는데”…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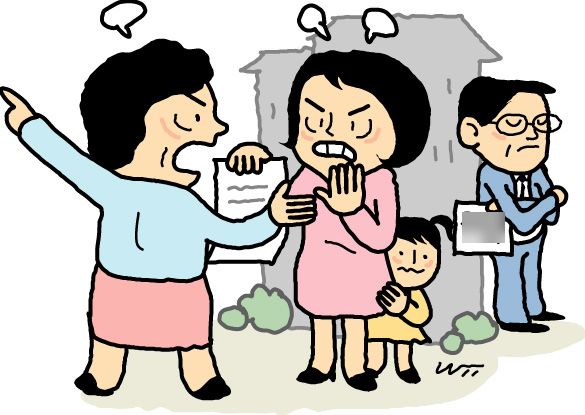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세입자 A씨는 최근 전세로 살던 주택의 소유주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세 계약 끝나는 날이 한참 남은 그는 집주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집주인이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세입자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남아 있는 전·월세 계약이 유효한지 알 수 없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인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지되고 계약이 만료되면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다. 이 때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 관리인을 말한다. 집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1인 가정일 경우도 해당 절차에 따른다. 이를 통해 집이 낙찰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만약 낙찰자가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고 버틸 경우 세입자는 낙찰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직접 경매에 뛰어들어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큰데, 이 경우 필요한 낙찰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으로 대신하는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낙찰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클 경우 모자라는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집주인 사망 시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주장할 권리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와 함께 거주한 배우자나 자녀 혹은 사실혼 관계도 상속인이 된다"며 "사실혼의 경우 2촌 이내 친족(부모형제)이 없다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고 2촌 이내 친족이 존재한다면 공동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 Celltrion receives U.S. FDA approval for EYDENZELT, biosimilar referencing EYLEA
- FDA approves expanded pediatric indications for YUFLYMA and unbranded adalimumab-aaty in the United States
- Hanmi's Next-Gen EZH1/2 Dual Inhibitor Demonstrates Safety and Anti-tumor Activity in Phase I Study
- Boryung Successfully Concludes 2025 Humans In Space Youth Final Competition
- "Avantor Commits to Supporting Next-Generation Bio Ecosystem Across Asia"
유튜브
사람들